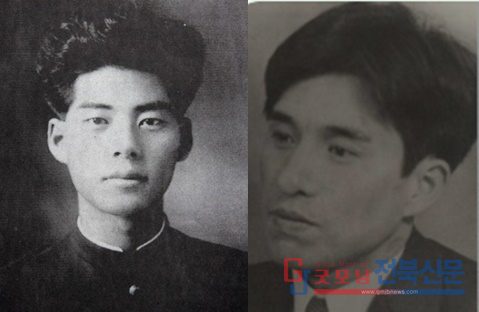
|
| 백석과 석정(사진_자료) |
[K 문학정담 - 7월의 시인 소개]
7월, 뜨거운 햇살 아래 두 명의 시인이 세상에 태어났다. 한 사람은 평안북도 설원을 닮은 시인 백석(본명 백기행, 1912년 7월 1일생)이고, 다른 한 사람은 남도의 들길과 능선을 닮은 신석정(1907년 7월 7일생)이다.
백석과 신석정—이 두 시인은 각기 다른 언어와 정서를 품고 있으면서도, 한국 현대시의 근원에서 함께 흐르는 두 물줄기였다. 그들의 생일이 불과 엿새 차이라는 사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를 사랑하는 이들에겐 운명처럼 느껴진다.
백석의 사랑 김영한은 「자야, 백석을 그리다」에서 “나는 그대를 ‘나타샤’라 불렀다”며 자신이 나타샤임을 강조했다. 사랑의 상대역, 인생, 피앙새를 강조할 정도로 백석은 일생을 사랑으로 살아냈다.
그렇듯, 백석의 시는 늘 ‘사랑’이라는 강물 위에서 흘렀다. 그 사랑의 정점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김영한이다. 기생 출신의 지식인으로, 백석은 그녀를 ‘나타샤’로 부르며 시로 사랑을 썼다.
백석의 유명한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는 그 정서가 절절히 묻어난 대표작이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밤도 푹푹 눈이 내린다.”
백석이 여인 김영한의 주장처럼 내가 나타샤다란 설과 러시아 영화 「전쟁과 평화」의 여주인공 나타샤 로스토바에서 이상형으로 따왔을 것이라는 설이 있으나 둘다 맞지 않느냐가 정설인 듯 하다.
이 시 속 흰 눈과 당나귀는 현실의 가난과 이별을 견디는 두 사람의 운명을 은유한다. 김영한은 훗날 회고록에서 “백석은 나를 시로 기억한 사람”이라며, “그 사람의 문장은 온기였다”고 고백한다. 이들은 결혼하지 못했고, 세상은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백석의 시는 김영한을 평생 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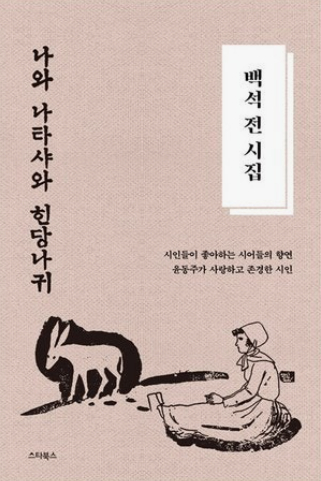
|
| 백석시집(사진_자료) |
신석정과 백석, 같은 달에 태어난 ‘다른 서정’
7월 7일 태어난 신석정 시인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평생을 호남 산천과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서정의 끝을 탐색한 시인이었다. 그의 대표작 「슬픈 구도」, 「대추 한 알」, 「임께서 부르시면」 등은 향토와 초현실의 결을 함께 간직하고 있다.
신석정은 백석과 문단 안팎에서 교류했고, 서로의 시세계를 존중하며 경쟁했다. 신석정은 백석의 시를 “땀냄새가 나는 시”라고 평했고, 백석은 신석정의 시에 대해 “산속 개울물 같은 청정함이 있다”고 응수했다.
둘의 교류는 단순한 문단 인맥이 아니었다. 1930~40년대 ‘문장’, ‘조광’ 등의 동인지나 잡지를 통해 나란히 발표한 작품들은 조선 서정시의 양대 山脈으로 평가받는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전주에 들른 백석이 신석정을 찾아 밤새 시와 술로 교감했다는 구술 기록도 있다.
두 시인의 시풍을 비교하자면 백석은 북방의 서늘함으로 석정은 남도의 따스함으로 대비된다.
백석의 시는 북방의 서늘한 정서, 민중의 삶과 조선말의 리듬을 바탕으로 한다. 방언과 구어체, 현실의 애환이 녹아 있어 ‘구체적이되 시적인 리얼리즘’을 완성했다. 특히 「여승」, 「고야」,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 등은 시대와 고향을 동시에 품은 명작이다.
반면 신석정의 시는 남도의 풍경과 향토의 영혼을 품고 있다. 그는 자연의 풍경 속에서 인생과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 초현실적 이미지와 내면의 관조가 돋보이며, 현실보다는 꿈과 기도의 시학에 가까웠다. 좌우명인 志在山高流水에도 자신의 의지는 높은 산과 흐르는 물에 있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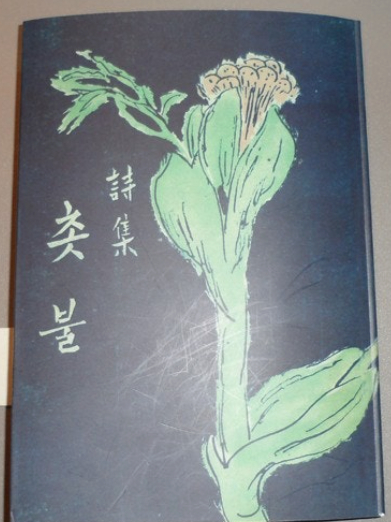 |
| 신석정시의 시집 '촛불'(사진_자료) |
7월에 태어난 두 시인, 그 문학적 유산을 보면 백석은 38선을 넘지 못하고 북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시는 남과 북을 초월해 지금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 신석정은 전북에서 시인으로, 교육자로, 비평가로 활동하며 말년까지 조용한 순례자의 삶을 걸었다.
이 두 시인의 시풍은 서로 닮지 않았지만, 모두가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백석은 사랑하는 여인과 민중의 고단한 삶을, 신석정은 자연과 존재의 신비를 통해 인간을 노래했다.
“시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 남는다”다는 말가 함꼐 7월, 한여름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두 시인을 우리는 다시 떠올린다.
백석과 신석정. 그들은 지금도 각자의 언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백석은 눈 내리는 평양에서, 신석정은 대숲 바람 이는 부안에서.
문학은 이렇게 남는다.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세상을 오래 바라본 이들이 남긴 말과 노래로.
[참고문헌]
- 백석, 백석시집 『사슴』, 1938. 조선일보사
- 「나와 나타샤와 당나귀」 1938
- 김영한 『자야, 백석을 그리다』 (김영한 회고록)효형출판 2002
- 한국현대문학대사전
- 한국문학번역원
- 전북문학회 구술기록자료,
- 나타샤 로스토바 - 전쟁과 평화 / 그레이트 코멧
- 정병욱, 『한국현대시와 서정의 구조』, 민음사, 1982
- 이태동, 『한국서정시의 원형과 구조』, 솔출판사, 2002
- 강상희, 「백석 시의 러시아문학 영향 연구」, 『현대문학연구』 제24호, 2007 이다.
2보에서는 석정의 맑은 물같은 사랑을 게제한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따뜻한 뉴스 행복한 만남 굿모닝전북신문



 홈
(사)K-문학정담
홈
(사)K-문학정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