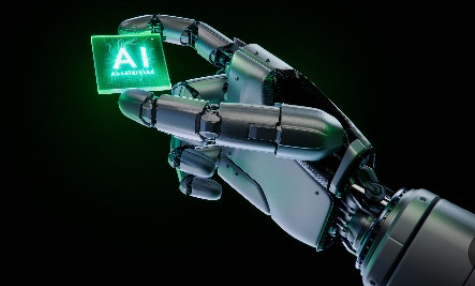
|
| 피지컬AI( 사진_자료) |
[오반장 칼럼] “피지컬 AI로 新전북시대 연다”…정동영 의원이 끌어낸 ‘게임 체인저’
229억 추경예산안을 382억으로 …‘죽어있던 예산’ 살려낸 정치력과 정의원 포함 조찬모임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당초 정부 2차 추경안에서 빠졌던 ‘피지컬 AI 실증 인프라’ 예산 229억 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극적으로 부활했다. 주인공은 정동영 의원(전주 병)이다. 과방위와 예결소위 간사로 뛰어다니며 기재부와 5차례 넘게 협상한 끝에 국비 229억, 지방비와 민간 153억을 더해 총 382억 원을 2025년 1차 연도 예산으로 끌어냈다. 이렇게 살안 난 피지컬 AI 사업이 정부·지자체·산업계가 공언한 향후 5년 총사업비는 1조 원 규모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전북특별자치도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정 의원은 “새만금 이후 30년째 허공을 맴돌던 전북의 미래 산업 구상이 드디어 실체를 갖췄다.”며 전북민들에게 희망의 메세지를 전달했다.
피지컬 AI는 생성형 AI가 디지털 텍스트를 다룬다면, 로봇·드론·자동차처럼 현실 공간을 직접 움직인다. 제조 데이터가 풍부한 한국형 산업구조와 궁합이 잘 맞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피지컬 AI는 ‘제조 AI 르네상스’를 열어 인구감소로 위축된 생산성을 다시 끌어올릴 열쇠”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피지컬 AI가 전북에 착륙하게 된 배경에는 산업 DNA라 불리는 전기차·수소상용차가 완주일대, 전주에 탄소섬유·농기계 등 ‘하드웨어 제조 클러스터’가 이미 자리 잡고 있어 힘이 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거치며 확보한 광활한 부지와 규제특구 인프라가 테스트 베드로 검중됐기 때문이다.
또한 강력한 정치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정동영과 이성윤 의원의 여야 공조, 김관영 지사의 ‘초광역 전북’ 구상, 과기정통부의 지방 AI 거점 다변화 전략이 맞물리며 ‘틈새’를 파고들어 성공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사업비는 국비가 금년도 229억과 2025~2030년까지 6,000억원 배정, 실증센터·데이터센터·로봇캠퍼스가 조성된다.
같은 기간 지방비 153억+ 2,000억은 부지 매입·도로·전력 인프라를 생성시키고. 민간분야는 100억+약 2,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장비·파운드리·벤처펀드가 조성된다면 2025년 382억과 향후 5년간 1조 원이 투입되며 플러스 알파로 2단계 이후 로봇콤플렉스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그야말로 장밋 빛이다. 빈집에 황소가 바리바리 들어왔다는 표현과 비슷하다.
도·산업계 내부 로드맵 기준에 따르면 2단계(2030년 이후)까지 포함하면 최대 2조 원 규모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사업에 버금간다는 말이다. 오히려 넘을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정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은 ‘파이낸셜 뉴스’에 따르면 전북 지역 경제에 네가지 선순환적 바람이 불어롤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탄소섬유·자동차·농생명 기계 현장에 로봇·AI옵스가 동시에 도입돼 ‘고부가 생산라인’으로 전환. 기존 노동집약형 공정 대비 생산성 +30 % 기대로 제조업 체질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한디.
둘째, KAIST–전북대-성균관대 등 공동 ‘피지컬 AI 대학원’ 설립 추진으로 석‧박사급 R&D 인력을 최초 100명에서 최종 1000명 수준으로 양성하면서 청년 인력 순유출을 완화시키면 고급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로 유출현상을 반전시킬 수 있다.
셋째, 실증센터 내부 ‘로봇 시뮬레이션 샌드박스’ 개방 → 부품·센서·AI칩 스타트업이 초기 투자·판로를 확보할 창구 형성.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확장으로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확장된다.
넷째, 현대차·네이버·리벨리온·구글클라우드, KAIST·전북대·경남대 등이 참여한 ‘Physical AI Global Alliance’ 결성(8월 예정). 기술표준·윤리규범을 국내에서 선점하면 수출시장 교두보 확보되면 산·학·연 글로벌 얼라이언스로 선한 영향력이 지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과 달리 순풍에 돛단 ‘장밋 빛’ 미래만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재정 지속성을 유지하려면 내년 이후 국비·지방비 매칭 비율 불확정성을 떨쳐내게 예비타당성 통과와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강력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전북의 취약성인 인력의 수도권과 대기업으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K-피지컬 AI에 학‧석사 통합 코스, 군 복무 대체연구원으로 확대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동영 의원이 따낸 382억 원은 단순한 지역 SOC 예산이 아니다. 제조업 기반 지역이 ‘AI 하드웨어 혁신’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드문 창구다. 어찌보면 낙후 전북이 AI산업을 선도하는 최전방 일류 선진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이다.
전북이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지역 소멸’과 ‘산업 공백’이라는 이중 위기를 피하기 어렵다.
반대로 피지컬 AI를 제대로 키워내면, 인구·경제·교육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전국 첫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치권의 예산 드라이브가 성공적인 산업화로 이어지려면 이제부터가 진짜 승부처라는 생각이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홈
오피니언
홈
오피니언
